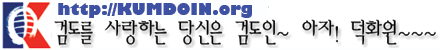| [본국검법] |
| 유 점 기 (대한검도회 사무국장, 교사 7단) |
| 서 언
본국검법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검법으로, 신라시대부터 전해오던 것이 조선 영조 때 간행된 "무예신보"에 처음 수록되었고, 이 "무예신보"를 증보한 "무예도보통지"가 조선 정조 14년(1790)에 간행되었는데 이 "무예도보통지"의 24기 중 하나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의 검법을 연구하고 수련함은 우리 검도인의 당연한 책무가 아닐 수 없으며, 현재 승단심사의 한 과목으로 채택되어 검도 수련자들이 필수로 익히게 되었으니 전래의 본국검법이 오늘날 다시 후손들에 의해 전승, 발전될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본국검법은 실기의 전승이 끊어지고 문헌으로만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무예도보통지의 검보나 총도를 보면 검법의 운용만을 순서에 따라 그려 놓았을 뿐이고 세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그 본래의 모습을 올바로 되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국검법의 연구와 재연은 1960년대부터 뜻있는 몇 분 선생님들에 의하여 다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며, 현재 우리가 행하고 있는 본국검법이 본래의 모습과 완벽히 일치한다고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승의 본국검법을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1)원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2) 검리에 맞게 해석하고, 3) 반복되는 수련에 의한 무리 없는 동작이 되도록 연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 검도인의 바른 자세라 생각된다.
본국검법의 재연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예도보통지의 부정확한 검보 및 미비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움직이는 동작을 그림 또는 글로써 전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실기가 직접 행하여지던 당시에는 무예도보통지의 검보와 도해가 훌륭한 보조수단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재연된 본국검법을 널리 전파하는 데에도 새삼 도보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본인의 본국검법 수련과정 등을 통하여 얻게 된 내용을 가급적 자세히 정리해 보고자 하였으며, 본국검법 각 세의 설명 내용에서, 통일된 자세의 본국검법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소 무리한 자세의 규격화를 시도해 보았다. 이 역시 성급한 규격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본국검법의 심층적 연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분명한 반대 의견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어 본국검법 연구에 일조 할 수도 있다는 기대도 가져 본다.
끝으로 본 기고는 검도 초급수련자를 주 대상으로 기술되었으며, 검도(이종림 저, 한국문원, 1996)의 부록 1. 본국검법을 기본 참고문헌으로 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혀둔다.
|
| 본 론
본국검법은 모두 33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격법이 12수, 자법이 9수로, 치고 찌르는 것이 모두 21수이다. 이 중 진전격적 3수, 후일격 3수, 향전살적 2수, 후일자 2수로 중복되는 것이 있기에 격법은 7종, 자법은 8종으로 총 15종의 격자법이 있다. 또한 방어법으로 우내략 1수, 향우방적(외략) 2수가 있으며 (총 3수), 기본자세로써 지검대적, 금계독립, 맹호은림, 조천, 좌협수두, 전기, 백원출동의 7종이 있으며, 이 중 금계독립만 3수가 있다. 정리하면, 격법 12수, 자법 9수, 방어법 3수, 기본자세 9수로 총 33세이다.
일반적으로 승단시험에서 본국검법은 예에 이은 발도로 시작되며, 처음의 지검대적에서 시작되어 마지막 33세인 시우상전으로 끝나게 된다. 본국검법의 연습을 위하여, 지검대적부터 각 세의 동작 및 의미, 그리고 가상의 공격과 방어의 상황을 순서대로 설명하고자 한다.
|
| 가. 범 례
1. 방향
처음 본국검법을 시작할 때(지검대적세)의 전면을 "후(後,뒤)"라 하고 후면은 "전(前,앞)"이라 하여 이 방향이 본국검법 전반에 예외 없이 적용되어 자세 이름에 "전"이나 "후"가 포함된 자세는 그 방향으로 전개된다. 예를 들면, 진전격적세, 향전살적세 등은 "전"을 향해 치거나 찌르며, 후일격 후일자세 등은 "후"를 향해 치거나 찌르는 것이다.
본국검법을 처음 대하는 수련생들은 이 방향을 혼돈하기 쉽기에, 본문의 설명에서는 시작방향을 북(후), 반대방향을 남(전)으로 하여 동서남북으로 정확한 방향표시를 하였으며, 각 세마다 남북 또는 전후를 병기하였다. <<오른쪽 그림>>
2. 각도 또는 칼의 기울기
칼을 세웠을 경우 (상단 또는 어깨 칼) 측면에서 본 칼의 각도(기울기)를 수직에서 몇도 등으로 기재하였다. 칼을 찌르는 방향 등도 가급적 각도로 표현하였고, 이 경우 수평에서 몇 도 등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몸을 돌리는 방향도 우/좌측으로 180도, 225도 등으로 표현하였으며, 이 경우 방위(동남향 등)도 병기하였다.
|
 |
3. 한발 및 일보
 |
한발은 발의 앞에서 뒤까지의 길이를 뜻하며, 그 사용 예로 "중단자세에서 왼발과 오른발은 전방을 향하되, 오른발은 왼발의 한발 앞에 위치한다"고 표현하였을 경우 오른발 끝과 왼발 앞은 같은 선상에 위치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일보는 칠 때 또는 찌를 때 왼발 또는 오른발이 한걸음 나아가 디디는 것을 뜻한다. |
 |
4. 중단세 또는 기본자세
현대검도의 중단세를 말하며, 중단세의 발 자세는 오른발이 왼발보다 한발 앞에 위치하는 것을 뜻한다.
5. 진전격적세와 진전살적세
검보와 언해에는 "진전격적"으로 표기 되었으나, 동일한 자세를 총보와 총도에는 "진전살적"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동일 자세의 2가지 이름으로 보아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
6. 대도, 발도, 납도
원전에는 지검대적에서 시작하여 시우상전으로 종료하므로 대도, 발도, 납도의 설명이 없다. 이것은 본국검법만이 아니라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24기 모두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재 검법을 시연하면서 칼집없이 칼만 들고 시작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원전에는 없으나 대도, 발도, 납도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대도 : 고리가 달린 칼집을 사용하며 고리에 끈을 매어 우측 어깨에 메고 칼은 왼쪽 허리에 오도록 한다. 이때 앞고리에 맨 끈의 여분으로 칼집을 허리에 고정시킨다.(칼집을 앞 뒤로 움직일수 있도록 약간 여유를 둔다.)
- 발도(A-1~4) : 왼손으로 칼날이 바깥으로 향하게 칼집을 잡고 오른손으로 칼자루 코등이 쪽을 가볍게 잡고 힘차게 칼을 뽑는다. 칼을 뽑는 방향은 정면의 우측 상 방향으로 하며, 칼을 완전히 뽑은 상태에서 칼은 자신의 가슴 높이 정도에 수평으로 위치하게 하여(칼날이 수평으로 전면을 향함), 칼을 뽑는 동작을 완료시킨다. 이때 칼과 오른팔은 120도 정도를 유지하며 칼끝이 몸의 중심 앞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이 자세에서 왼발을 앞으로 당기면서 왼쪽어깨로 칼을 가져가서 지검대적세를 취한다.
- 납도 : 맨 끝에 설명함.
|

 |
|
| 나. 본국검법 33세
1. 지검대적(持劍對賊)
발은 어깨넓이 정도로 벌려 자연스럽게 선다. 칼은 왼쪽 어깨에 메듯이 하되 코등이가 자신의 어깨 높이에 위치하고, 약간 뒤로 눕혀지게 한다 (뒤로 45도). 칼날은 앞을 향하도록 하고 오른 주먹은 왼쪽 어깨 중앙에 오도록 하고 왼 팔꿈치는 몸에 붙여 몸 뒤로 빠지지 않게 한다. 시선은 정면에 둔다.(북향, 후면)
이 자세는 발도 후 상대와 대적하는 기본자세로써 공격 및 방어로 전환이 자유로운 자세이다. 본국검법의 순서는 사방에서 둘러싼 적들을 가상하고 이에 대한 공격과 방어로 33세가 짜여져있다고 할 수 있다. 지검대적에서는 적이 오른쪽에서 찔러오는 것으로 가정하고 우내략에 들어간다. |
 |
|
 |
2. 우내략(右內掠)
지검대적(1)에서 칼을 오른쪽 아래로 향하여 몸 가까이 스쳐 (칼날의 흐름이 수직에서 우로 약 15도 정도의 면을 통과하는 수준) 왼발을 축으로 오른발을 바닥에 스치듯이 들어 오른쪽으로 몸을 180도 돌리면서 칼을 머리 위로 바로 든다. (남향, 전면)  |
 |
 |
 |
|
이때 칼은 상단자세로 칼날을 정면을 향하여 바로 들며 칼끝이 처지지 않게 한다 (들은 칼의 각도는 옆에서 보았을때 수평위 30~60도 정도). 우내략은 지검대적(1)에서 우측의 공격을 방어하고 다음의 진전격적(3)으로 전면의 적을 공격하는 연결동작이다. 우내략의 종료 동작은 순간적으로는 오른발이 앞에 나와 있는 우상단자세가 되나, 칼을 들은 상단자세에서 바로 이어 진전격적(3)에 들어간다.
* 우상단세: 양손으로 칼을 머리 위로 둔 자세이며, 칼은 자신의 몸 중앙에 바르게 위치한다. 왼손은 자신의 이마 위에 두고 칼끝의 방향은 옆에서 보았을 때 수평에서 약 30도에 이르게 한다. 칼날은 전면을 향하고, 오른발이 앞으로 나오며 양발 모두 바르게 앞으로 향하게 한다. |
 |
3. 진전격적(進前擊賊)
우내략(2)과 곧바로 이어지는 자세로 우내략과 한 동작처럼 이어 치면 된다. 들었던 칼로 오른발을 앞으로 일보 내면서 정면 머리를 치되 배꼽까지 내려 벤다. 이때 뒤의 왼발은 중단자세의 발 자세가 되도록 재빨리 따라붙는다. 오른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왼손으로 칼끝이 원을 그리듯 큰 동작으로 벤다. 동작을 마친 후 상대의 배꼽까지 베었음으로 칼은 옆에서 보았을 때 거의 수평이 되며, 오른팔은 바르게 펴진 상태에서 오른 주먹이 자신의 하복부 높이에 이르게 된다 (남향, 전면).
|
 |
4. 금계독립(金鷄獨立)
진전격적세(3)에서 머리 위로 팔을 뻗으며 칼을 높이 들었다가 오른 어깨 쪽으로 내리면서 (칼날은 앞을 향하고, 코등이는 입 높이, 칼은 수직에서 30도 뒤로 약간 눕힘), 오른발을 축으로 왼쪽으로 180도 돌아 왼 무릎을 직각이 되도록 들어올리고 오른발 하나로 후면을 향하여 선다(오른발은 정면에 대하여 45도 우측을 향하게 하여 중심잡기에 용이하게 함). 이때 왼쪽 다리와 발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든다. (북향, 후면)
금계독립세는 정면에 대한 위력적인 공격준비자세로, 어깨 칼의 위치가 지검대적세보다 공격에 용이하게 조금 더 높이 들은 것을 주의 하여야 한다. 상체는 왼쪽 어깨가 약간 앞으로 나오도록 틀어지며, 왼쪽 무릎은 정북향을 하고, 들어올린 왼발은 무릎 이하에 힘을 빼었기에 발끝이 자연스럽게 조금 아래로 향하게 된다.
|
 |
|